모 사이트에서 친근함을 쌓게 된 ㄱ님.
현재 한국에 있는데 내가 책을 좋아한다니까 연말에 맞춰 (사실 내 생일에 맞게 도착~)
책을 보내주셨다. 쌩유 베리 감사, 선생!!! ^^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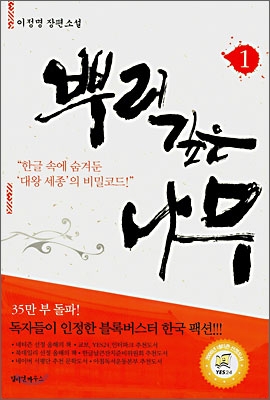
요 위의 사진은 naver.com에서 가져옴
총 2권으로 이루어진 "뿌리깊은 나무"는 이정명씨의 장편소설로, 한마디로 이 소설을 평가하자면
"조선판 CSI"라고 하면 될까?! :)
태평성대로 알려진 세종시대.
세종임금은 말년에 몸이 좀 아프시긴 했지만,
현명하게 자신의 임기(?)를 꽉꽉 채워 전 방면에 걸쳐 조선시대를 발전시킨 임금 정도로
알고 있었던 나로서는,
비록 픽션이긴 하지만 그 세종대왕도 보수파 (여기서 말하는 '보수파"란 새 것에 둔감하고
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..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. 내가 그 대표적 케이스)의 반발에
괴로움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당했다는 설정은,
정말이지 역사서를 그리도 좋아하는 내가 여지껏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시대적 배경이랄까?
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하면 꽤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.
조선왕조 중 내가 젤루 좋아하는 시대는 세종대왕시기. 가장 애틋한 시기는 단종시기.
이 소설에 등장하는 집현전 학자들 이름을 떠올리면서 나는 단종 숙청이 떠올라
맘이 참 아팠다.
그래. 새 것에 민감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힘든 법이지..
밑에 포스트에 이어,
인수위 사람들이, 새로 대통령으로 당첨(이라고 표현하더군. ^^;;)된 분이
이 책 한 번 읽어봐줬으면 하는 마음이다.
난 투표권을 가진 한 명의 국민이기 이전에 애를 키우는 엄마라 그런지
운하 파는 것보다 (이것도 물론 열 퐉! 받음) 교육정책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.
미국나라에 사는 한국계 엄마들은 비싼 배송비 들여 한국 전집을 끌여들어
한글도 영어만큼 가르치려고 난리가 났는데
왜들 그러십니까요.. ㅡ.ㅡ
다시 한 번 내 의견 강조. 그렇게 영어가 좋으면 영어나 영어로 제대로 가르치삼!!!
현재 한국에 있는데 내가 책을 좋아한다니까 연말에 맞춰 (사실 내 생일에 맞게 도착~)
책을 보내주셨다. 쌩유 베리 감사, 선생!!! ^^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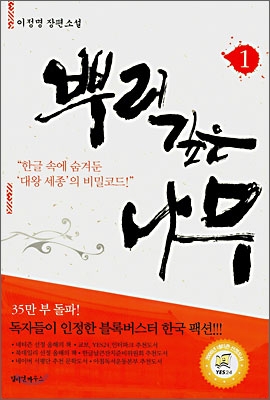
요 위의 사진은 naver.com에서 가져옴
총 2권으로 이루어진 "뿌리깊은 나무"는 이정명씨의 장편소설로, 한마디로 이 소설을 평가하자면
"조선판 CSI"라고 하면 될까?! :)
태평성대로 알려진 세종시대.
세종임금은 말년에 몸이 좀 아프시긴 했지만,
현명하게 자신의 임기(?)를 꽉꽉 채워 전 방면에 걸쳐 조선시대를 발전시킨 임금 정도로
알고 있었던 나로서는,
비록 픽션이긴 하지만 그 세종대왕도 보수파 (여기서 말하는 '보수파"란 새 것에 둔감하고
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..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. 내가 그 대표적 케이스)의 반발에
괴로움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당했다는 설정은,
정말이지 역사서를 그리도 좋아하는 내가 여지껏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시대적 배경이랄까?
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하면 꽤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.
조선왕조 중 내가 젤루 좋아하는 시대는 세종대왕시기. 가장 애틋한 시기는 단종시기.
이 소설에 등장하는 집현전 학자들 이름을 떠올리면서 나는 단종 숙청이 떠올라
맘이 참 아팠다.
그래. 새 것에 민감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힘든 법이지..
밑에 포스트에 이어,
인수위 사람들이, 새로 대통령으로 당첨(이라고 표현하더군. ^^;;)된 분이
이 책 한 번 읽어봐줬으면 하는 마음이다.
난 투표권을 가진 한 명의 국민이기 이전에 애를 키우는 엄마라 그런지
운하 파는 것보다 (이것도 물론 열 퐉! 받음) 교육정책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.
미국나라에 사는 한국계 엄마들은 비싼 배송비 들여 한국 전집을 끌여들어
한글도 영어만큼 가르치려고 난리가 났는데
왜들 그러십니까요.. ㅡ.ㅡ
다시 한 번 내 의견 강조. 그렇게 영어가 좋으면 영어나 영어로 제대로 가르치삼!!!

